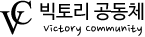두 집의 어르신댁을 방문했다. 얘길 나누고, '당당해지세요' 당부를 하며, '언제든 맘이 갑갑하면 절 찾으세요'라는 말을 남기고 발걸음도 씩씩하게 해실해실 웃으며 집을 나서는 날 발견하고 물었다. 이게 너인가? 그렇다. 이건 나이다. 거짓이 아닌 나이다. 결혼이민자에게 " 저를 만난 건 이제부터 행운이 온다는 뜻이랍니다"며 낯 뜨거운 소릴 지껄일 적에도 변함없이 나는 진실을 말했다고 믿었다. 그건 너였나? 역시 나였다. 하지만 지금의 넌? 지금도 나이다. 그럼 넌 둘인가? 아니 난 하나이다. 자신감에 차 당당히 해실거리는 것도 나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고 괴로워 하는 것도 나이다. 그럼 넌 가면을 쓴 두 개의 인격을 가졌는가? 아닌데... 넌 도플갱어인가? 아닌데...
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손잡아 주고 미소를 지어주는 나는 분명 나이다. 환한 웃음 짓는 나는 분명 나이다. 그럼 네 삶의 그 힘듬은? 네 맘속의 그 죄성은? 네 갈등은? 그 문제들은? 모르겠다. 하지만 다른 이의 고통을 들을 때면 현실의 나는 사라 진다. 그저 그들의 삶을 듣는 귀만 남은 내가 존재한다. 그리고 그속에서 해실거리는 나만 남는다. 날아갈 듯 뛰고 있는 나만 있다. 그리고 그때의 난 자신있고 당당해야만 했다.
그런 날 어떤 뇌성 친구는 '캔디'라고 불러 주었다. 괴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... 그래, 난 캔디가 되고 싶었다. 강한...
하지만 뇌성 친구가 날 캔디라 불렀을 때도, 웃고 있는 난 울고 있었다. 속으로는 갈등과 모순과 괴리감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다. 하지만 난 해실해실 웃고 있었다. 그래서 암껏도 아닌 티비 드라말 보며 줄줄 흐르는 눈물을 주체못해 혼자 보고자 하고, 그만치 울 내용인지 모르지만 만화책을 보면서도 울고, 소설책을 보면서도 운다. 그래서 성장 소설을 즐기는 지도 모르겠다. 적당한 핑계를 댈 수 있어서...
하지만 오늘의 난, 요즘의 난, 아니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지난한 삶을 듣는 난, 난 속으로도 울지 않았다. 그때의 내겐 울어야 할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. 현실의 내가 없다. 그럼 난 비현실의 존재로 껍데기로 사람들을 만나는가? 아닌데...
내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(?) 일까? 한 상황에선 다른 상황의 자신을 까맣게,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는 천부적인 기억력(=건망증)을 지녀서 일까? 어떤 게 진짜 나일까? 둘 다 나인데... 정말 모르겠다...... 암 걱정도 없이 티없이 밝아보이고 잘 웃는 나도 그때는 진실이고, 괴롭고 괴롭고 괴로운 나도, 슬픈 나도 동시에 존재하는 나인데 ... 슬픔을 잊고 웃음짓는 난 거짓일까?
현실에 발붙이지 못하고 부양하는 것일까? 그래서 늘 사람들 속에 있음에도 물위의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둥둥 떠있음을 느끼는 걸까?
* 죄송합니다. 독백에 익숙해서... 한동안 잠잠하다 다시금 치미는 감정입니다. 아니 늘 스스로에게 아닌 척 숨기던 감정일 지도 모르겠습니다. 현실의 괴로움을 다른 것들로 슬쩍 대치해 아닌 척 하지만 그것들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암껏도 안되는 데, 자꾸만 현실에서 도망가는 날 보는 것도 같고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또한 내 일이고 내 현실이라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늘 헷갈립니다. 오늘 날듯이 당당히 걷는 내가 문득 궁금했습니다. 이래도 되는 거야?...
아, 갑자기 넌 행복한가?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. 그런데.... 답을 하지 못하는 날 발견했습니다... 아까의 난 분명 즐거워 보였는데 그럼 그때의 난 누구였을까요?